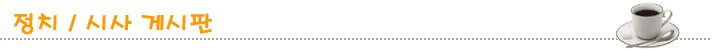중국은 우리에게 누구인가? -신복룡 건국대 정치학과 명예교수
중국은 우리에게 누구인가? -신복룡 건국대 정치학과 명예교수
페이지 정보
유샤인관련링크
본문
중국은 우리에게 누구인가?
신복룡
건국대 정치학과 명예교수
(※ 앞글 몇 마디: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차이나 타운' 건설 논란이 한창인 이때, 중국에 전도된
한국의 위정자들과 많은 국민들이 중국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라 생각되어 전달합니다.
ㅡ 모산 ㅡ)
공자(孔子)가 천하를 주유하던 어느날, 황하 강변에 이르러 동쪽으로 흘러가는 물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제자 자공(子貢)이 “왜 물만 바라보십니까?"하고 여쭈니,
공자가 대답하기를 “물의 이치를 생각하고 있다.
물은 참으로 위대하다.
물은 만번을 꺾여 흐르지만, 반드시 동쪽으로 흘러가니 이는 사람이 사는 의지와 같다.”
(萬折也必東 似志) 하였다.
[荀子 宥坐 편]
공자는 중국의 지형이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음에 따라 흐르는 물의 이치를 설명했을 뿐이다.
그런데 그를 숭모하는 유학자들이 거기에 의미를 보탰다.
조선의 유생들은 명나라가 멸망하고 중화의 맥이 끊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공자의 가르침이 끝내 동방인 조선에만 남아 있다고 감격하면서 팔도 각처에 “만절필동”(萬折必東)을 석벽에 새겨 넣었다.
그 가운데 어필(御筆)이라 하여 화양동의 암각을 가장 큰 볼거리로 여겼다.
나의 고향은 충북 괴산이고 어머니는 그곳 청천면 솔맹리(松面里, 화양동)에 친정이 있어 어머니의 등에 업혀 화양동의 눈길을 간 기억이 새롭고, 그 뒤로 이런저런 일로 여러 차례 갔다.
처음에는 멋모르고 사당으로 올라가는 돌계단의 경사가 70도라는 사실이 위험하고 짜증스러웠다.
뒷날, 세상에 눈뜨고 글을 읽은 다음에는 소중화(小中華)의 백성이 어찌 중국 천자(天子)를 뵈러 올라가면서 똑바로 서서 올라갈수 있겠는가?
“개처럼 기어 올라갔다가 개처럼 기어 내려오라” 는 뜻으로 그렇게 지었음을 알았을때 우리에게 중국은 누구인가를 많이 생각해보았다.
소중화의 논리와 책임
송시열의 소중화 논리인즉, 임진왜란 때 다 망해가던 조선을 살려준 대명(大明) 천자(명나라 황제)의 재조지은(再造之恩)에 대한 보답과 병자호란의 국치(國恥)를 씻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의 시각(時角)은 주자학이라는 대롱[管見]에 좁혀 있었다.
원시인의 동굴 입구가 남향임에도 불구하고 동쪽인 줄로만 알고 살던, 이른바 베이컨(F. Bacon)이 말한 원시인들의 “동굴의 편견”(idola specus)에 사로 잡혔던 조선의 유생들은 마치 갈라파고스 거북 증후군처럼 퇴화하면서 주자학 안에 자신을 가두었다.
그들은 안짱다리(矮, 倭왜, 일본)의 난학(蘭學 네델란드 신학문)을 거부하면서
세계 조류에서 밀려나기 시작했다.
그 결과가 망국(亡國 나라의 멸망)이었다.
거슬러 올라가면, 여진족의 하급(下級) 무사(武士)로서 명나라로부터 정통성을 부여받아야 고려 백성을 다스릴 수 있었던 이성계(李成桂)의 “큰 나라를 거역할수 없다.”(以小逆大不可)는 개국의 명분에서 종속(宗屬)이 시작되었다.
현대적 개념으로 보면 사대란 굴욕이 아니라는데 그 점에서 한국사는 정직하지 않다.
한국이 중국에 조공(租貢)과 인질(人質)을 바쳤다는 서술은 국사책에서 금기어(禁忌語)가 됐다.
그런 일련의 역사 인식을 대변하는 것이 삼전도비(三田渡碑)를 땅에 묻은 사건이었다.
치욕의 역사(dark history)도 가르쳐야 한다.
어두운 역사가 없는 민족이나 국가가 없다.
한(漢)나라 황제는 흉노(匈奴)에 딸을 바쳤다.
민족 분노의 시대에 신채호(申采浩)처럼 비분강개할 수 있지만, 역사는 화해하는 것이지 적개심을 함양하는 도량은 아니다.
동양 최고의 빌딩이라는 롯데타워를 배경으로 삼전도비(三田渡碑)를 바라보노라면 심경이 착잡하다.
끝까지 싸우자던 김상헌(金尙憲)보다는 최명길(崔鳴吉)의 고민이 더 깊었을 것이다.
인조(仁祖)는 남한산성에서 죽음[黃天 황천]을 뜻하는 황토를 길에 깔고,
몸을 일곱 마디 낸다는 뜻으로 여섯번 새끼줄로 묶고, 상여(喪與)에 올라 산에서 내려왔다.
그때 그와 울며 따르는 신하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만동묘와 삼전도비를 보면 지금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그림이 떠오르련만,
이 시대의 지도자나 민초(民草)들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럼에도 한 가지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은 중국이 말하는 이른바 사이팔만(四夷八蠻)가운데 지금 독립국가로 남아있는 나라는 오직 한국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에 대한 애증(愛憎)이 더욱 깊어만 간다.
지금의 중국지도부나 주한 중국 대사들은 아직도 리훙장(李鴻章 이홍장)이나 위안스카이(袁世凱 원세개)의 사고(思考)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왜 우리가 중국에 고마워해야 할 일이 없겠는가?
그러나 우리의 역사학을 보면 “착한 사마리아인”은 종교적 이상주의에서나 볼 수 있지,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은원(恩怨)의 5천 년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추억보다 쓰린 기억이 더 많다.
선린(善隣)이란 외교적 수사(修辭)일뿐 한중관계에서 그런 일은 아주 드물다.
그러므로 우리의 역사학은 민중의 눈으로부터 백내장(白內障)을 제거해야 한다.
그 백내장의 정체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중국이 “큰 시장”이라는 막연한 기대인데, 이는 이미 1940년대에 루즈벨트 (FDR)의 오판(誤判)임이 입증되었다.
생선 뱃속에 납덩이를 넣어서 파는것이 중국의 진정한 모습이다.
베이징(北京)대학 시절, 후스(胡適호적)는 “중국이 협상하러 올 때는
그들의 속임수[虛僞 허위]를 조심하라.” (1935)는 말을 남겼다.
두 번째는
중국이 “통일의 지렛대”라는 몽환적(夢幻的) 대국주의이다.
중국은 남북통일을 시켜줄 힘은 없어도 저지(沮止)할 힘은 있다. 이게 비극적이다.
지금처럼 한국이 중국에 기울 경우, 두 가지의 걸림돌이 있다.
먼저는 미국과의 관계이다.
외교에서는 “적(敵)의 적(敵)은 동지(同志)이며, 적의 동지는 적”이라 셈법이 성립되지 않는다.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이 끝날 때까지 한국을 지켜줄 것이다, 그 뒤에는?
한국을 버릴 수도 있다.
을사조약 때 제일 먼저 일본을 위한 축배를 든 것은 미국이었다.
처음 버리기가 어렵지 두 번째 버릴 때는 덜 망설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한국전쟁에서 그들의 젊은이 2만5천명이 사망, 실종했고,
그 가운데 200명이 장군의 아들이었다.
한국인 장군의 자식 중에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어찌 끝날지 예견하기는 어렵지만 길게 가면 중국이 이길 것이다. 미국도 그것을 잘 알고 있다.
중국은 어떤 사태를 놓고 시계와 달력을 잘 보지 않는 민족이다.
그 다음은 일본의 문제이다.
한국인 치고 누구인들 일본에 적의(敵意)가 없을까만은 우리는 대일관계에서
일정한 체념(諦念)이 필요하다.
신숙주(申叔舟)가 운명이 가까웠다는 말을 듣고 성종(成宗)이 승지를 보내어
“나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유언(遺言)이 무엇이오?” 라고 물었을때, 신숙주는 “일본과 등지지 마십시오.” [失和]라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는다.
아무리 미워도 안국역 지하철 3호선의 안전문 유리에 “일본놈 저며 죽이자” [屠戮]는 시를 써붙인 것은 문명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
도쿄(東京) 긴자(銀座)역에 “조센징 찢어 죽이자”는 광고가 걸리면 우리의 심정은 어떻겠는가?
왜 지식인과 언론은 이에 침묵하는가?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일본은 우리에게 중국보다 가깝다.
몇십만명의 병자호란 환향녀 (還鄕女)는 잊은채 왜 종군위안부만 안타까운가?
그러니 한국은 어디로 가야 하나?
그리스의 정치가 페리클레스(Pericles)의 주장에 따르면, “강대국은 베푸는 것으로 동맹을 맺지, 받는 기쁨으로 동맹을 맺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중국은 베푸는 나라가 아니다. 중국이 우리를 “동맹”이나 “아픔을 나눌 형제”로 여길까? 그렇지 않다.
왜 그들의 레이더(radar)는 우리를 샅샅이 들여다 보고 있는데, 우리는 사드(THAAD)를 배치하면 안되는가?
펑유란(馮友蘭)의 책 한 줄 인용했다고 우방(友邦)이 될 만큼 중국은 그리 가볍지 않다.
이제 우리의 살길은 강소(强小) 국가로 가는 것이다.
이제는 봉신(封臣)의 시대도 아니고, 미국대사관 담장에 올라가
“주한미군 철수반대”의 혈서(血書)를 쓰는 것이 우국(憂國)이던 시대도 아니다.
우리의 운명의 주인은 우리밖에 없다.
국난기(國難期)에 애국자가 넘쳐나는 때도 없었지만, 애국자가 없었던 시절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에는 지사(志士)도 없고 책사(策士)도 보이지 않는다.
보이느니 “빨대” 뿐이다.
그 점이 두렵고 걱정스럽다.
시대를 탓하고 운명이라 하기에는 우리의 현실이 슬프고, 우리는 어차피 그렇게 살았지만 이런 삶을 우리의 후손(後孫)에게 물려줄 수야 없지 않은가?
※ 전 건국대학교 신복룡 석좌교수의 좋은 글
방정한 옮김 2021. 5. 05.
???????? 많은 생각을 하게하는 글이라서 옮겨봅니다.????????
작성일2021-05-08 23:5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