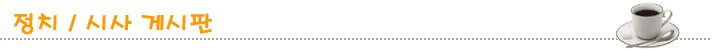참 남루한 한국의 정치엘리트들
참 남루한 한국의 정치엘리트들
페이지 정보
산들강관련링크
본문
대선 후보들 공통점은 학생 때 공부 좀 했다는 것과
甲의 전쟁에서 살아남은 것
균형감 리더십 교양은 물론 심지어 유머감각도 안 보여
노원명 기자입력
윈스턴 처칠이 쓴 '제2차 세계대전'은 기록문학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처칠에게 노벨 문학상을 안겼다. 당대의 영웅이 직접 쓴 본격 역사서는 시대를 통틀어 드문 것인데 심지어 이 책은 재미도 있다. 이 책을 읽을 때는 처칠이 '영국주의자'라는 사실을 전제해야 한다. 영국과 영국인에 대한 자부심으로 넘쳐나 보는 이에 따라선 거슬릴 수 있다. 그런데 필자는 이 책의 가장 큰 미덕 중 하나가 앵글로색슨족의 위대한 자질을 효과적으로 서술한 데 있다고 생각한다. 본받을 대목이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가 나치 독일에 무너진 1940년 6월 세계는 영국이 독일에 맞서 싸울지 궁금해했다. 히틀러는 영국이 힘든 상대라는 걸 알았다. 그는 강화를 원했고 마땅히 영국도 그러리라 생각했다. '영국은 안전을 보장받고 독일은 유럽을 먹는다.' 착각이었다. 처칠은 이렇게 썼다. "(강화 의제가) 내각에 상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공개 회의에서도 다뤄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미래 세대들은 믿기 어려울 것이다." 당시 영국의 정치 리더들은 한 명 예외 없이 조국과 기독교 문명의 수호를 위해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2년 전 뮌헨에서 히틀러에게 평화를 구걸했던 전 총리 네빌 체임벌린조차 이 시점에는 '전사'가 되어 있었다.
현실은 역사책을 읽는 것과는 다르다. 믿었던 프랑스가 무릎을 꿇고, 앞서 됭케르크 철수 때 기갑과 기관포 전력 대부분을 잃고, 해군을 제외한 모든 전력이 열세이며, 독일 전투기가 몇십 분 만에 영국해협을 건너 런던을 공습할 수 있는 상황, 게다가 강화라는 선택지가 있는 기로에서 전쟁을 결의할 수 있는 민족은 많지 않다. 영국은 그렇게 했다.
처칠의 잘난 척이 나는 고깝기보다는 고맙다. 그 오연(傲然)한 영국인의 자존심이 없었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딘가 이지러져 있을 것이다. 처칠과 동시대에 또 한 명의 위대한 앵글로색슨 지도자 루스벨트가 대서양 너머에 사자처럼 버티고 있었다는 우연도 인류에겐 행운이었다. 영국 단독으로는 히틀러의 진격을 멈추기 어려웠을 것이다.
처칠과 루스벨트에게 굳이 앵글로색슨이란 인종 꼬리표를 다는 것은 앵글로색슨의 문명 토양이 그런 엘리트를 만들었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선과 악이 결전할 때 타협하지 않는 기독교적 정의감, 정의감을 행동으로 뒷받침하는 상무정신, 여하한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긍정적 기질과 자기확신, 평소에는 느슨하다 위기가 닥치면 응집하고 그 와중에 발휘되는 융통성과 창의력. 이것이 앵글로색슨인들이 근대 이후 세계에 과시한 자질이다.
한국 대선판을 지켜보다 '왜 한국의 정치 엘리트들은 이처럼 남루한가' 하는 회한에 빠져들곤 한다. 여당은 경선이 끝났고 야당도 막바지인데 후보들이 쏟아낸 언설 중에 무엇 하나 가슴을 친 것이 없다. 비전도, 시대정신도, 진지한 고민도, 통렬함도, 심지어 유머조차 없다. 대장동과 몇몇 음모론이 있었을 뿐이다. 그 와중에 야당은 점(占) 얘기로 벌써 며칠을 지새우고 있다.
후보들의 공통점은 학창 시절 공부깨나 했다는 것이다. 그 덕에 갑의 직업을 얻고 갑들 간의 생존게임을 여러 번 통과해 지금 자리에 섰다. 앵글로색슨 리더들에게 보편적인 지덕체의 균형감, 리더십, 교양을 습득할 시간은 좀처럼 없었을 것이고 실제 드러난 밑천도 그렇다. 한 번도 다수를 위해 희생해보지 않은 사람이 입만 열면 '국민, 국민' 하니 식상하고 짜증스럽다. 저들이 국가 운명의 갈림길에서 영국의 엘리트들이 한 것 같은 결단을 할 수 있을까.
한국 사회에서 탁월한 인재들이 정치를 택하지 않은 지 벌써 꽤 됐다. 그런데 저 남루한 '나머지'들에게 맡겨질 역사의 무게는 여전히 무겁다. 그래서 앵글로색슨 사회의 비결이 궁금해지는 것이고 그럴수록 현실에 울화통이 치민다.
[노원명 오피니언부장]
[이 게시물은 SFKorean님에 의해 2021-10-28 16:41:51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甲의 전쟁에서 살아남은 것
균형감 리더십 교양은 물론 심지어 유머감각도 안 보여
노원명 기자입력
윈스턴 처칠이 쓴 '제2차 세계대전'은 기록문학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처칠에게 노벨 문학상을 안겼다. 당대의 영웅이 직접 쓴 본격 역사서는 시대를 통틀어 드문 것인데 심지어 이 책은 재미도 있다. 이 책을 읽을 때는 처칠이 '영국주의자'라는 사실을 전제해야 한다. 영국과 영국인에 대한 자부심으로 넘쳐나 보는 이에 따라선 거슬릴 수 있다. 그런데 필자는 이 책의 가장 큰 미덕 중 하나가 앵글로색슨족의 위대한 자질을 효과적으로 서술한 데 있다고 생각한다. 본받을 대목이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가 나치 독일에 무너진 1940년 6월 세계는 영국이 독일에 맞서 싸울지 궁금해했다. 히틀러는 영국이 힘든 상대라는 걸 알았다. 그는 강화를 원했고 마땅히 영국도 그러리라 생각했다. '영국은 안전을 보장받고 독일은 유럽을 먹는다.' 착각이었다. 처칠은 이렇게 썼다. "(강화 의제가) 내각에 상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공개 회의에서도 다뤄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미래 세대들은 믿기 어려울 것이다." 당시 영국의 정치 리더들은 한 명 예외 없이 조국과 기독교 문명의 수호를 위해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2년 전 뮌헨에서 히틀러에게 평화를 구걸했던 전 총리 네빌 체임벌린조차 이 시점에는 '전사'가 되어 있었다.
현실은 역사책을 읽는 것과는 다르다. 믿었던 프랑스가 무릎을 꿇고, 앞서 됭케르크 철수 때 기갑과 기관포 전력 대부분을 잃고, 해군을 제외한 모든 전력이 열세이며, 독일 전투기가 몇십 분 만에 영국해협을 건너 런던을 공습할 수 있는 상황, 게다가 강화라는 선택지가 있는 기로에서 전쟁을 결의할 수 있는 민족은 많지 않다. 영국은 그렇게 했다.
처칠의 잘난 척이 나는 고깝기보다는 고맙다. 그 오연(傲然)한 영국인의 자존심이 없었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딘가 이지러져 있을 것이다. 처칠과 동시대에 또 한 명의 위대한 앵글로색슨 지도자 루스벨트가 대서양 너머에 사자처럼 버티고 있었다는 우연도 인류에겐 행운이었다. 영국 단독으로는 히틀러의 진격을 멈추기 어려웠을 것이다.
처칠과 루스벨트에게 굳이 앵글로색슨이란 인종 꼬리표를 다는 것은 앵글로색슨의 문명 토양이 그런 엘리트를 만들었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선과 악이 결전할 때 타협하지 않는 기독교적 정의감, 정의감을 행동으로 뒷받침하는 상무정신, 여하한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긍정적 기질과 자기확신, 평소에는 느슨하다 위기가 닥치면 응집하고 그 와중에 발휘되는 융통성과 창의력. 이것이 앵글로색슨인들이 근대 이후 세계에 과시한 자질이다.
한국 대선판을 지켜보다 '왜 한국의 정치 엘리트들은 이처럼 남루한가' 하는 회한에 빠져들곤 한다. 여당은 경선이 끝났고 야당도 막바지인데 후보들이 쏟아낸 언설 중에 무엇 하나 가슴을 친 것이 없다. 비전도, 시대정신도, 진지한 고민도, 통렬함도, 심지어 유머조차 없다. 대장동과 몇몇 음모론이 있었을 뿐이다. 그 와중에 야당은 점(占) 얘기로 벌써 며칠을 지새우고 있다.
후보들의 공통점은 학창 시절 공부깨나 했다는 것이다. 그 덕에 갑의 직업을 얻고 갑들 간의 생존게임을 여러 번 통과해 지금 자리에 섰다. 앵글로색슨 리더들에게 보편적인 지덕체의 균형감, 리더십, 교양을 습득할 시간은 좀처럼 없었을 것이고 실제 드러난 밑천도 그렇다. 한 번도 다수를 위해 희생해보지 않은 사람이 입만 열면 '국민, 국민' 하니 식상하고 짜증스럽다. 저들이 국가 운명의 갈림길에서 영국의 엘리트들이 한 것 같은 결단을 할 수 있을까.
한국 사회에서 탁월한 인재들이 정치를 택하지 않은 지 벌써 꽤 됐다. 그런데 저 남루한 '나머지'들에게 맡겨질 역사의 무게는 여전히 무겁다. 그래서 앵글로색슨 사회의 비결이 궁금해지는 것이고 그럴수록 현실에 울화통이 치민다.
[노원명 오피니언부장]
[이 게시물은 SFKorean님에 의해 2021-10-28 16:41:51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추천 2
작성일2021-10-28 10:49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